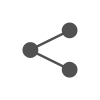이 책을 읽는 동안 몇 개의 퍼즐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이라고 이야기 했던 어렸을 때의 기억.
우리는 왜 장애인의 반대말이 비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럼 장애인은 정상인이 아닐까요? 어쩌면 장애가 정상이 아니라는 무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장애우’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기억.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친구라는 의미로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그 의미는 장애인을 주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퍼즐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분은 중증장애(언어 및 신체장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어눌하게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분이었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자기 몫을 충분히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만, 그 분을 대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때로 함께 업무를 해야 할 경우, 그 분은 전화로 업무협의를 하곤 하였습니다. 사실,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 분은 자기장애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오는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불편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통화가 끝나면 “그냥 문자를 주셔도 되는데..”하면서 투덜대곤 하였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중증장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을 대하는 저의 모습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왜 기다리지 못했고 저는 왜 투덜되었을까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내 일상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제 업무가 더디어졌을 때, [함께]와 [더불어]가 없어져버렸듯이 말입니다.
장애의 불편함을 참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조금 불편해져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