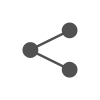소란스러운 동거의 저자 은영이는 36년 내 인생에서 유일한 장애인 친구였다. 지금은 연락을 하고 지내진 않지만, 06학번 인문대생 동기로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함께 생활한 내 인생 유일무이한 장애인 친구… 작은 체구에 늘 자기 몸집만한 노트북을 짊어지고, 헝클어진 단발머리를 질끈 묶고 캠퍼스 이곳 저곳을 누비던 은영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주변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나 역시도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진 않았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어 나가야 할 사회 문제에 큰 관심도 없었다. 장애인들이 매일 마주해야 할 일상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겨웠을지 읽는 내내 마음이 저려왔다. 장애인들을 향한 어줍지 않은 동정과 연민, 위로의 말 따위를 건내기 싫어서 그들을 피했었다. 내 모습이 어쩌면 장애인을 향한 나의 편견이며 무관심을 에둘러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던 건 아닐까 싶다.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또 한 형태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쉽게 여겼던 내가 부끄러워 지기도 했다. 정작 하나님은 그런 몸의 불편, 통증으로 인해 아픔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깊은 흐느낌으로 흔들리는 당신의 어깨를 보여 주셨다”는 구절이 마음 깊이 남았다.
나와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몸의 불편을 갖고 살 수도, 소수자 집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제3자의 입장을 그만 멈추고 싶다. 누구든 아플 수 있다. 나도 아플 수 있다. 아픈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겠다. 소수자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모두가 살고 싶은 사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작은 관심에서 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자! 내가 내게 주어진 오늘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글을 마친다.
P.S. 은영 작가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으니 용기 내어 연락해 볼까 싶다. 이렇게 멋진 작가가 되어준 은영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